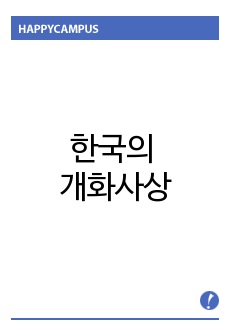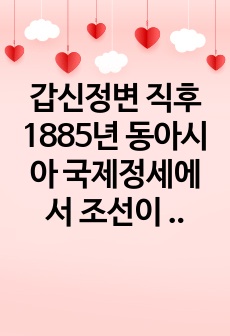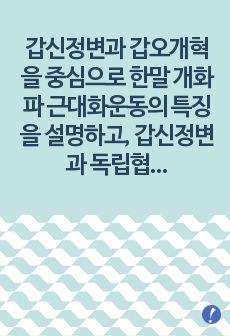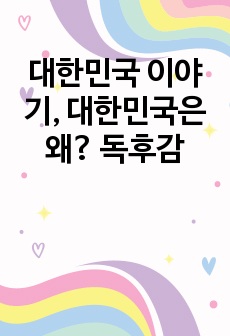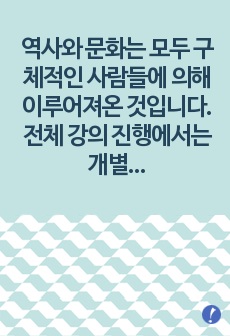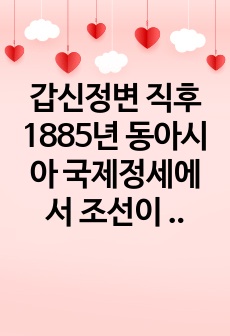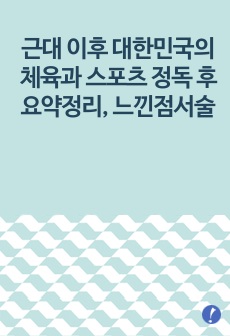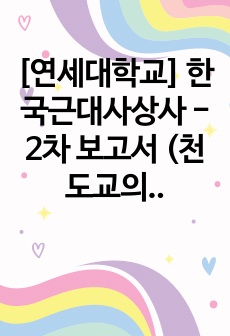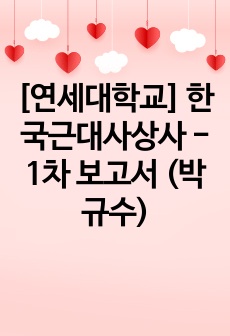-
미리보기
목차
Ⅰ. 머리말
Ⅱ. 개화론의 대두
1. 개항
2. 초기 개화파와 개화사상
Ⅲ. 개화파의 분리
1. 온건 개화파
2. 급진 개화파
Ⅳ. 갑신정변
Ⅴ. 맺음말본문내용
Ⅰ. 머리말
조선 후기에 들어 우리나라의 봉건적 사회구조는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농촌에서 상품생산이 발전하고 도시에서 상공업이 성장하면서 양반은 지주, 평민은 소작농 또는 빈민이라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부의 분배양상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양반과 평민을 철저히 구분하던 유교적 신분제도가 위태로워진 반면, 부를 축적한 평민층에 대한 지방관들의 각종 수탈도 극심해졌다. 인민들 사이에 부가 축적되고 지방관의 수탈에 대한 저항의식이 높아지면서 1811년 평안도 농민전쟁, 1862년 농민항쟁 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의 항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876년의 개항 이후 가속화되었다. 개항을 계기로 조선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강제로 편입되었고, 이에 조선의 지배층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개화세력(開化勢力)과 이를 전면 거부하면서 기존의 가치질서를 고수하려는 척사세력(斥邪勢力)으로 양분되었다.
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봉건적 사회체제의 와해를 두려워한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는 1882년 임오군란 일으켜 정권을 잡으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정권을 잡은 개화세력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막아냄과 동시에 그들의 선진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적 국가를 만들고자하였다.
Ⅱ. 개화론의 대두
1. 개항
1873년 서양과 통상을 완강히 반대하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하게 되자, 왕비를 비롯한 민씨(閔氏) 일파가 정치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의 대외정책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정안에서도 외국에 문을 열어 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조선보다 훨씬 앞서 개항을 하고, 1868년에는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라고 불리는 천황 중심의 근대적 개혁을 단행한 일본은 조선으로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일본은 대원군이 물러난 것을 조선을 개국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군함 운요호를 조선 연안에 파견하였다. 운요호는 부산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를 측정하고 함포를 쏘면서 무력 행위를 벌였다참고자료
· 김신재(1999), 『갑신정변기 변법개화파의 대외인식과 자주국권론』,동국사학 제33집 83p-107p
· 『자료모음 근현대 한국탐사』, 1994, 권태억 외,
· 『환재 박규수 연구』 2008, 창비, 김명호
· 『한국사 11 근대민족의 형성 1』 1994, 한길사, 강만길 저 외 173명
· 『아틀라스 한국사』 2009, 사계절,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 『한국역사입문(3)』, 1996, 한국역사연구회 엮음,태그
-
자료후기
Ai 리뷰지식판매자가 등록한 자료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돋보입니다. 과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료가 많이 등록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
한국의 개화사상 9페이지
2. 초기 개화파의 태동 : 박규수 개화사상은 사상적으로 18세기 후반 실학자들인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북학파(北學派) 사상과 19세기 중엽 김정희, 이규경, 최한기의 사상과 이어지고 있다. 이같이 개화사상은 그 원형을 실학사상 중 북학파의 사상을 주로 계승하였다. 실학과 개화사상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초기 개화파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 -
개화사상의 형성과 전개 7페이지
Ⅰ. 머리말 19세기 한국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당시 위정척사, 동도서기 등 여러 사상이 생겨났다. 개화는 이러한 사상 중에 하나이다. 개화사상에 대한 연구경향을 검토해보면 개화사상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분화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존재한다. 이광린은 개화기의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은 갑신정..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