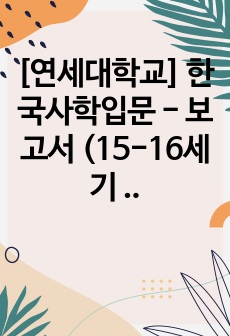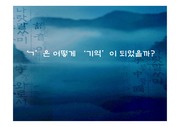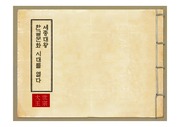-
미리보기
소개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의 한국어 표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훈민정음 창제 이전 우리말 표기
1) 한자 차용 표기법
2) 이두
3) 구결
4) 향찰
2.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
(1) 초성
(2) 중성
(3) 종성
(4) 자모의 이름
3. 훈민정음의 운용
1) 연철표기와 분철표기
2) 8종성법
3) 모아쓰기와 풀어쓰기
4) 음소적 표기와 형태음소적 표기
참고문헌본문내용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도 한국인들은 한자를 활용하여 자국어인 한국어를 표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이두, 향찰, 구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자를 통해 한국어를 표기하였다.
1) 한자 차용 표기법
한자 차용 표기법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한국어를 표기한 방법으로 이름과 지명 같은 고유명사를 표기하는 데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 차용 표기법은 한자의 소리만 취한 표음적 기능, 한자의 의미만 취한 표의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표음적 기능: 古(고)라는 한자에서 ‘옛, 오랜’이라는 의미는 버리고 ‘고’라는 음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된 한자를 ‘음독자’라고 부른다.
② 표의적 기능: 水[물]라는 한자를 ‘수’라는 음은 상관하지 않고 ‘매’, ‘믈’ 등과 같이 의미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된 한자를 ‘석독자’, ‘훈독자’라고 한다.
음독자를 활용한 표기는 한자 형성 원리 중 ‘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도 사용하던 방법이지만, 훈독으로 표기하는 방식은 고유의 표기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음독이나 훈독만으로는 인물이나 지명을 만족스럽게 표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훈독과 음독 두 가지 방식 모두 활용하여 표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시조(始祖)로 알려진 ‘혁거세(朴赫居世)’는 ‘불구내(弗矩內)’라고도 표기되어 있는데 ‘혁거세’는 훈-음-훈으로 표기하고, ‘불구내’는 음-음-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이두
이두(吏讀)는 한국어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한 노력이 단어를 넘어 문장으로까지 확장되며 발전한 표기 방법이다. 이두는 신라에서 크게 발달한 표기 방법으로, 한문 문장이 한국어 어순에 따라 재배치되어 있으며 조사와 어미까지 표기되어 있다.
「임신서기석」의 “今自三年以後”라는 표기에서는 원칙적인 한문 어순(自今)이 아닌 한국어 ‘지금부터’와 같은 어순(今自)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可容行誓之”에서는 ‘之’가 동사의 종결형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고자료
· 박은용(1978), 「固有女人稱號 「召史」 에 對하여」, 『여성문제연구』 7,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지형(1999), 「同名異記 人名語의 音韻 語原 -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 『어원연구』 제2호, 한국어원학회.
· 배대온(2004), 「여자 이름 ‘召史’에 대하여」, 『배달말』 35, 배달말학회
· 김지형(2007),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활용한 한국어 자모 및 발음 교육 방안」,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 백두현(2013), 「작업 단계로 본 훈민정음 제자 과정과 원리」, 『한글』 제301호, 한글학회.
· 김성규(2021), 「훈민정음 창제 초기의 종성 표기 원칙」, 『관악어문연구』 46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희승, 안병희, 한재영(2018), 『보정 한글 맞춤법 강의』, (학)신구학원신구문화사.
·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향찰(鄕札),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2985, (2023. 9. 13. 검색).
·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획자(加劃字),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4521. (2023.09.17. 검색).태그
-
자료후기
Ai 리뷰지식판매자의 자료는 질이 높고,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많아 학습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유익한 자료를 기대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