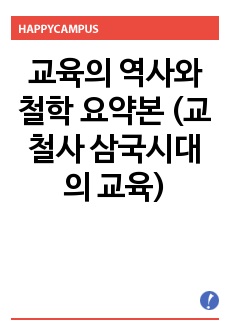-
미리보기
소개
"불교와 유교 그리고 무속"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
2. 무속 신앙 발표
1) 무속의 기원
2) 무속의 시대사
3) 풍수
4) 무속의 특징
3. 불교의 흡수와 영향
1) 불교의 흡수
2) 귀신관, 구원관 그리고 장례문화
4. ‘관계’와 ‘연속성’의 종교, 유교
1) 유교를 종교라고 볼 수 있는가?
2) 유교에서의 믿음, "관계"를 통한 구원
3) 유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사고, “연속성”
4) 제사에 관하여....
5) 유교가 한국역사에서 흥할 수 있었던 이유
6. 결론
본문내용
서론
무속, 불교, 혹은 유교가 받아들여졌던 것은 인간의 보편적 필요인 '구원'의 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궁극 가치나 진리에 대한 물음에 답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세구복과 의지처에 관한 대중 일반의 관심에 답해준 것이다. (무속은 후자에만 해당. 유교는 조선 건국 즈음에야 구원의 종교가 됨.) 각 종교는 시대에 따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이념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영향만을 갖기도 하고, 정치원리나 문화소양으로서의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종교는 아닌) 지위를 갖기도 한다. 불교국가 1천 년, 유교국가 5백 년 동안 각각의 종교가 어떤 점 때문에,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무속 신앙 발표
1. 무속의 기원
무속이란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무복(巫服)을 입고 춤을 춤으로써 보이지 않는 신을 강신(降神)하게 하는 능력을 지닌 여사제(女司祭)를 중심으로 이어져 오는 종교습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속은 한반도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샤머니즘이 그렇듯, 무속의 기원 역시 불분명하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토속 종교들이 그렇듯이 인류가 고등한 정신 체계를 가지면서 자연과 영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로 인해 자연스레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고조선의 군주인 단군 왕검에서 단군이 제사장을 의미한다는 기록과 삼한에 무당이 다스리는 소도(蘇塗)가 존재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미 역사 시대에 접어들기 전 무속이 형성되었고, 무당이 정치적 지도자도 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무속의 시대사
삼국시대가 시작되고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무속은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예가 『삼국유사』에서 신라 초기 왕을 뜻했던 단어 중 하나인 ‘차차웅’이 무당을 칭했다는 단어나, 신라 왕실의 여성이 시조제를 주관했다는 점에서 왕 혹은 왕실의 인사가 무당이 되어 제를 주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참고자료
· 강영경, 『고대 한국 무속의 역사적 전개 - 신라 진평왕대의 辟鬼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10, 2005.8.
· 김갑동, 『고려시대 巫俗信仰의 전개와 변화』,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78, 2016.4.
· 이기백, 『한국 風水地理說의 기원』, 일조각, 한국사 시민강좌 제 14집, 1994.2, p.7.
· 강제훈, 『조선 왕릉과 왕릉 의례의 특징』,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제54호, 2014.2.
· 손태도, 『조선 후기의 무속』, 한국무속학회, 한국무속학 17, 2008.8.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한국사』, 새문사, 201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이창엽, 『한국불교 장례(葬禮)의례에 나타난 죽음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8
· 이혜정, 『한국 고대 불교문화와 토착신앙의 융합』,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최종석,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민족사, 2017
· 한성렬, 『불교 죽음관과 상장례의 콘텐츠화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태그
-
자료후기
Ai 리뷰지식판매자의 자료는 질이 높고,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많아 학습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유익한 자료를 기대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