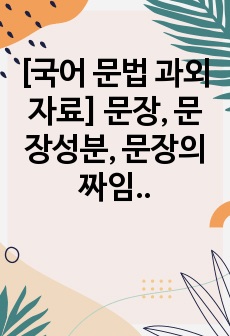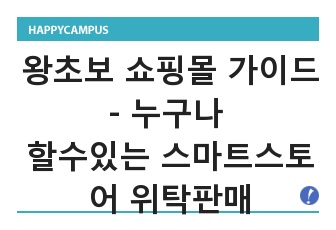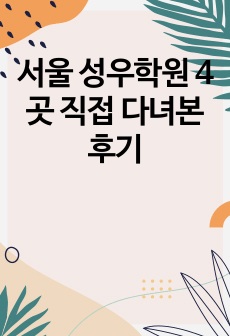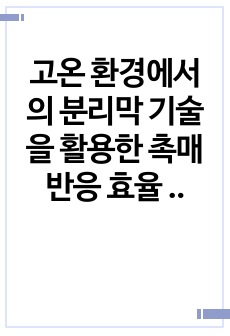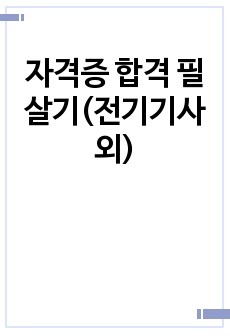전혜린과 뮌헨
- 최초 등록일
- 1999.02.24
- 최종 저작일
- 1999.02
- 3페이지/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 가격 무료

다운로드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학으로 만나는 역사 / 14
전혜린과 뮌헨
시인도 아니었다. 소설가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평론가도 아니었다. 굳이 딱지를 붙이자면
`번역문학가'라고나 할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이
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가 그 이름을 뒷받침하는 번역서 목록의 일부다. 번역이 아닌 그
자신의 글이라고는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는, 하인리히 뵐의 소설 제목을 차용한
산문집, 그리고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는 제목으로 묶인 일기가 전부인 여자.
근엄한 문학사에서는 그 여자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자의 글들
은 이른바 문학적 가치나 문학사적 의미와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차라리
사회사적·정신사적 범주에 놓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 여자를 형성시킨 것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상처와 폐허였으며, 그 여자가 형성
에 기여한 것은 60년대 한국의 미숙한 실존주의적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50년대 후
반 4년간의 독일 체험이 놓인다. 인간 실존의 근본적 조건에 절망하고 삶의 구체적 세목이
보이는 평범과 비속을 혐오했던,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순간순간을 불꽃처
럼 치열하게 살고자 했던 여자. 한국이라는 박토에 뿌리내리기보다는 뮌헨의 자유를 호흡하
고자 했으며, 여자의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보편적 성을 지향했던 여자. 인간이라는 육체
적 현존이 아닌 정신과 관념만의 그 어떤 추상적 존재를 열망했던, 그리하여, 당연하게도,
마침내는, 좌초했던 여자. 그 여자의 이름 전혜린.
참고 자료
없음